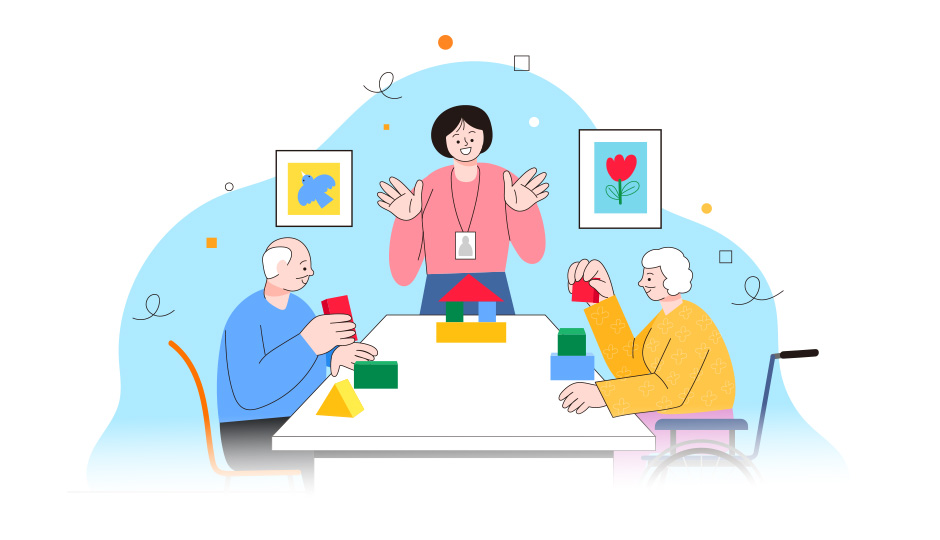
2023년 10월, 마침내 치매안심센터에서의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내 나이가 어느덧 40대를 훌쩍 넘어선 시점에서의 새로운 도전이라, 솔직히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다는 설렘과, 그동안 쌓아온 간호 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 저를 이 길로 이끌었습니다.
몇 번의 고배 끝에 어렵게 얻어낸 소중한 기회였기에, 첫 출근 날 아침의 긴장감과 설렘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출근길에 스치는 가을 바람마저 달리 느껴졌고, 발걸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업무가 제 앞에 펼쳐질 것을 생각하니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전까지는 병원에서 임상간호사로 근무하며, ‘찾아오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정해진 공간과 절차 속에서 환자를 맞이하고, 정해진 시간과 방식에 맞춰 처치와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 안에서의 간호는 안전하고 체계적이었지만, 어쩐지 어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늘 마음 한켠에 자리했습니다.
그 공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마음속에는 늘 ‘내가 환자 곁에 더 다가갈 방법은 없을까?’ 하는 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해답을 깨닫게 해준 곳이 바로 치매안심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의 돌봄은 제가 이제껏 행해 왔던 간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자가 찾아오는 간호’가 아닌 ‘찾아가는 돌봄’.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발걸음을 옮겨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그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만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낯설면서도 신선한 접근은 제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가방을 메고 어르신 댁을 향해 걸어가는 길 위에서, 저는 매일 생생한 삶의 무게를 마주합니다.
골목마다 다른 풍경, 문을 열면 풍기는 생활의 냄새, 가구와 벽에 스민 세월의 흔적들…
마치 한 권의 두꺼운 인생 책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각 집마다의 사연과 시간이 저를 맞이하고, 저는 그 인생책을 조심스레 펼쳐서 이야기를 꺼내 봅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맞춤형 사례관리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어르신 중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주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을 만나 인지 활동을 함께하고, 투약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 시 다양한 지역 복지 서비스 자원을 연계합니다.
단순히 건강 상태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살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학습지, 퍼즐, 만들기 등 인지자극활동을 함께하며 나누는 대화는 제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분은 젊은 시절의 사진을 꺼내 보이며 그때의 추억 속으로 천천히 여행을 떠나고,
또 어떤 분은 작은 손 편지 하나에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움을 표현하십니다.
그 진심 어린 표정 앞에서 저는 ‘이 일을 선택하길 참 잘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물론 현실은 언제나 따뜻한 장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좁고 어두운 방 한 칸에서, 위생과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뵐 때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병원에서는 결코 마주할 수 없었던,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 속에서 저는 돌봄이 단순히 의학적 처치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이런 현장을 경험하며 저는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단순히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 인터넷 검색이나 전화 문의조차 큰 장벽이었고, 복지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어도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는 닿지 않는 현실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메우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르신들께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그 변화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깊이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생기고, 더 잘하고 싶다는 열정이 차오릅니다.
복지관, 행정복지센터, 소방서, 경찰서, 자활센터 등과의 협업도 점점 능숙해지고,지역 내 복지망이 저의 머릿속에 지도처럼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아직도 첫 대상자와의 만남은 잊지 못합니다.
아흔이 훌쩍 넘은 독거 어르신께 조호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여쭌 후 돌아서려던 찰나,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너무 좋은 세상이야. 나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고맙다, 고마워. 너는 늙지 마라. 계속 이렇게 젊어라.”
그 따뜻한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문 밖까지 천천히 배웅해 주시던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감사의 인사를 받는 나의 일이 얼마나 보람되고, 또 얼마나 책임감이 큰 업무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의 하루하루는 도전이자 배움입니다.
매일 새로운 얼굴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며, 그 속에서 저는 ‘돌봄의 본질’을 배워갑니다.
특히 부산 강서구처럼 지리적으로 넓고, 도심부터 섬까지 다양한 주거지가 있는 지역에서 일하며 저는 단순한 간호사를 넘어 ‘지역 돌봄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곳에서 정말 생활이 가능할까’ 싶은 열악한 공간도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런 곳일수록 제 발걸음은 더 바빠집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어떤 자원을 연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한 돌봄을 실현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라도 만들어내기 위해, 오늘도 저는 가방을 메고 길 위에 서 있습니다.